|
[리우=스포츠서울 김현기기자]하기노 고스케(22·일본)와 조셉 아이작 스쿨링(21·싱가포르), 드미트리 발라딘(21·카자흐스탄)은 2016 리우 올림픽에서 수영 경영 종목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선수들입니다. 하나 덧붙이면 2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딴 선수들입니다. 하기노는 4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 개인혼영 400m 동메달을 따서 대성의 싹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른 두 선수들은 런던 올림픽 때만 해도 10대 중·후반의 어린 선수들에 불과했는데 리우에서 새로운 영웅이 됐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린 문학박태환수영장을 거의 매일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활약상을 눈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기노는 대회 MVP에 오를 만큼 대단한 인상을 남겼으니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발라딘은 평영 3종목(50·100·200m)을 모두 석권했는데, 우승할 때마다 영화 ‘터미네이터’를 흉내내려는 듯 엄지를 치켜든 뒤 물 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쿨링은 당시에도 깜짝 금메달로 평가받았습니다. 그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자 한 수영 관계자가 “싱가포르엔 중국에서 넘어온 선수들밖에 없는데…”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쿨링은 당시만 해도 체구가 왜소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 와서보니 뱃살이 보일 정도로 몸집과 힘을 키웠습니다. 한국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도 수영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 없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따는 것에 그쳤습니다. 은메달은 여자 혼계영 400m에서 중국의 실격으로 얻은 어부지리 은메달이었고, 개인전 입상은 남자 접영 50m 금메달 하나 뿐이었습니다. 이마저 올림픽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 베트남, 카자흐스탄 선수들도 척척 메달을 따낼 때 한국 수영은 아시아에서도 힘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20~30년 전만 해도 아시아에서 잘하는 것과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에서 잘하는 것의 상관 관계가 적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스쿨링이 마이클 펠프스의 리우 올림픽 6관왕을 저지하고, 하기노와 발라딘이 각각 개인혼영과 평영에서 아시안게임-올림픽 연속 우승에 성공했다는 점은 아시아 무대의 성공이 세계 무대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수영도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차지한 박태환이 2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은메달을 각각 하나씩 거머쥐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잘하던 선수들이 금세 올림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수영이 아시아에서부터 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기초 종목인 육상도 그렇습니다. 종목 특성상 수영처럼 우승까지 내달릴 순 없지만 남자 100m에선 중국과 일본이 각각 두 명씩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그 중 야마가타 료타는 0.04초 차로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물론 100m에선 이 격차도 작다고 할 순 없습니다). 멀리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도 아시안게임 혹은 아시아선수권 금메달리스트가 결승까지 올라 5~6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에 리우 올림픽은 양궁과 사격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남자축구가 8강 탈락하면서 파장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육상 수영 체조 사이클 등 메달이 많은 기초 종목이 취약하다보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4년 뒤 도쿄 올림픽, 또 파리나 부다페스트, 로마, LA 중 한 곳에서 열릴 2024 올림픽 때 업그레이드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육상과 수영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아시아에서부터 통해야 합니다. 리우 올림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silva@sportsseoul.com
기사추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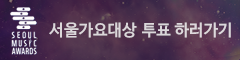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SS포토]200m 금메달 확정 짓고 환호하는 쑨양](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16/08/17/news/2016081701001083900083461.jpg)














![‘동성 키스신’으로 화제 모았던 혜리, 이번엔 파격 비키니 뒤태 공개[★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3/A1500415_5_20250313134655.png)



![K-POP 최고를 가린다…제34회 서울가요대상 본상 투표 24일 시작 [34th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1921d3a0042f451981c3bde33db697c4_P1.jpg)





![“엄마 나라로 꺼지라니요?” 황민우·황민호 형제 향한 시대착오적 악플[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4/03/news-p.v1.20250403.f0602e57fcc64cf99f4e98a078365fd8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