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우=스포츠서울 이정수기자]2016 리우 올림픽 한국 선수단은 당초 목표였던 ‘10-10’(금메달 10개 이상 획득-종합순위 10위 이내)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선 색깔을 떠나 국민들에 안겨준 기적과 감동의 메달들이 적지 않았다. 그냥 딴 메달이 아니라 스토리가 확실했던 메달이 꽤 됐다는 뜻이다. 펜싱 박상영이 전해준 ‘할 수 있다’ 신드롬부터 한국 양궁의 싹쓸이 금메달, 레슬링 김현우와 골프 박인비가 일궈낸 부상 투혼 등은 열대야에 시달리던 국민들 가슴을 뻥 뚫어준 청량제였다. 엘리트 스포츠가 단순한 국력 발휘를 넘어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어느 곳에서도 가져다줄 수 없는 국가적 희망을 던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대회였다.
◇통합의 시대? 엘리트 체육의 역할은 있다최근 국내 일각에서는 금메달과 국격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견해와 맞물려 엘리트 스포츠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체육으로 국가 위상을 높이고 나라 이름을 알리는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시선을 ‘후진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엘리트 스포츠가 성적에 과도하게 집중해 많은 이들의 희생을 담보했던 잘못된 관습은 분명 지양해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한국 스포츠 위상을 높여온 것은 국가대표 선수를 육성하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메달을 따내고 이를 지켜보는 국내 스포츠팬들이 즐거움과 희열을 느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종목별 편중 현상은 있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은 지구 정반대 브라질에서 투혼을 불사르며 순위에 관계없이 국민들 성원을 받았다. 엘리트 스포츠 자체의 필요성과 역할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국내 체육계가 통합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엘리트 스포츠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기존 장점은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박상영의 ‘할 수 있다’,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국민적 자긍심이었다
어느 때보다 한국 선수단 메달 하나하나에 담긴 메시지와 스토리가 많았던 대회가 바로 리우 올림픽이었다.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10-14로 뒤진 상황을 일거에 뒤집으며 대반전 드라마를 펼친 박상영이 좋은 예다. 그의 경기력 자체도 눈부셨지만 4점이나 지면서 상대 선수에 한 점만 내주면 은메달이 확정되는 벼랑 끝에서 “나는 할 수 있다,할 수 있다”고 독백한 뒤 역전을 일궈낸 스토리는 리우 올림픽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되면서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국민적 자긍심이 됐다. 수천억원을 들여도 제작할 수 없는 훌륭한 홍보물이 됐다. 박상영의 ‘할 수 있다’ 정신을 김종현(사격 남자 50m 공기소총 복사 은메달) 김현우 박인비 손연재(리듬체조 개인전 4위) 등이 물려받아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 특유의 정신력과 근성으로 시상대에 오르고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20~30대 한국 청년들이 기성세대의 시각처럼 ‘나약하고 떨어지는’ 계층이 아니라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한 ‘시리즈물’이라고 봐도 좋다. 예전처럼 은·동메달을 따면, 메달도 없이 4~5위를 하면 패자처럼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리우 올림픽 태권도 남자 선수들(동3)처럼 박수치고 기뻐한 것도 반길 만하다. 등수를 떠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들의 모습은 결과주의에 매몰된 기존 한국사회 패러다임을 깨기 위한 몸짓이었다.
◇엘리트 스포츠의 가치, 메달을 떠나면 더 업그레이드된다최종삼 태릉선수촌장겸 한국선수단 총감독은 “이번 리우 올림픽을 치르면서 엘리트 스포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나라가 강하고 약하다고 평가할 수 없을 만큼 평준화되고 있는데 국내 엘리트 스포츠 인구는 최근 몇년 사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유도와 레슬링 복싱 등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투기 종목은 기피 종목이 되어 전력이 급감하는 게 현실이다. 탁구와 배드민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엘리트 스포츠의 의미가 메달, 더 나아가 금메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리우 올림픽을 통해 입증됐다. 과거 한국보다 더 메달을 강조했던 중국도 ‘스포츠 정신’과 ‘매너’를 강조하며 리우에서 땀을 흘렸다. 자본주의 스포츠로 불리는 골프 여자 개인전에서 펑샨샨이 동메달을 따자 우승 이상의 의미를 둔 것이 좋은 예다. ‘금메달 몇 개’의 틀을 떠나 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참가한 선수 개개인이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모습이 더 많이 비춰지는 것은 한국을 떠나 세계적인,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런 패러다임 위에서 바라보면 엘리트 스포츠의 가치도 재평가될 수 있다. 이번 리우 올림픽은 그에 대한 출발점이 됐다.
polaris@sportsseoul.com
기사추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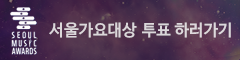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SS포토]마지막 포인트를 따내는 박상영, \'5점을~\'](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16/08/23/news/2016082301001495200116191.jpg)









![‘조재현 딸’ 조혜정, 칸 빛낸 핑크빛 드레스 자태…감출 수 없는 볼륨감 [★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5/A1512590_9_20250504101516.png)









![본상 독주 제베원, K팝 초이스 베몬, 영탁 3관왕… 2차 투표 마감 [제34회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5/12/news-p.v1.20250512.550038a2c6834743a513a56ead4590b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