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은 프로야구 10구단 시대 원년이다. 신생팀 KT는 비록 올해 퓨처스리그라는 리허설을 거치지만,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1군무대에 이름을 알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구단 체제가 궤도에 오르고, 신축구장이 들어서면 관중 1000만 시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실제로 KBO는 프로야구 중기 발전계획에 ‘관중 1000만 시대가 열리면 각 구단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프로야구가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올해 광주 KIA챔피언스필드를 시작으로 내년 수원, 2016년 대구구장이 완공되고 마산구장 문제가 해결되면 1000만 시대를 바라볼 기반이 마련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구단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겉으로는 “구단의 재정자립도가 좋아지면 선수단의 처우도 좋아질 것이다. 산업으로 확대돼 구단별 매출이 웬만한 기업만큼 생긴다면, 프로야구 선수협회(선수협)가 주장하는 최저연봉 4000~5000만원시대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 KBO와 각 구단이 협력해 프로야구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가 구단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털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출범 이후 32년 동안 ‘기업 홍보’라는 외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또하나의 기업체로 탈바꿈하는 게 탐탁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 일류로 성장한 기업, 아직도 홍보가 필요한가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 깊숙히 개입한 한 야구원로는 “언제까지 80년대 슬로건을 갖고 갈 것인가? 삼성 LG 같은 굴지의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룹은 세계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는데도 프로야구를 포함한 스포츠단을 기업 홍보의 매개체 혹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여긴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매년 각 경제연구소는 프로야구가 일으키는 경제효과가 1조 5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다. 이른바 ‘빅마켓’으로 불리는 롯데나 LG 두산 등이 지역경제등에 미치는 영향도 2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로 성장했다. 전국구구단인 기업이 국민들에게 상품을 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겼으니 여가선용이라도 하라는 듯 선심쓰듯 야구단을 운영한다는 발상은 곤란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사회환원’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강건너 불구경하는 기업주는 세상에 없다.
|
◇사점(死點)을 두려워 하면 완주는 커녕 시작도 못해
어떤 종목이든 처음 운동을 시작하면 사점(死點)에 이른다. 숨을 쉴 수 없을 것같은 공포감이 드는 현상인데,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나 처음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겪는 일종의 과정이다. 사점을 넘기지 못하면, 완주는 커녕 해당종목을 쳐다보기도 힘들만큼 고통스럽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스포츠를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고 한 단계 올라서야 한다. 하지만 현재 프로야구 각 구단주들 중 사점을 딛고 프로야구를 산업으로 발전시켜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 몇이나 있을까. 창단 초기 온갖 루머와 눈총을 받은 넥센 이장석 대표 정도가 사점을 딛고 프로야구라는 산업을 통해 기업(구단)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정도다. 다른 구단들은 조금만 아쉬운 소리를 해 구단주를 납득시키면 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200억원 이상을 쉽게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굳이 자생노력을 하지 않아도 한 해 소요되는 250~300억원의 예산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국내 최초의 친환경 야구장’인증을 받기 위해 관중석에 사각지대를 만들고, 덕아웃에서 좌우 선상이 보이지 않는 이상한 형태의 구장을 만들어도 KIA가 손놓고 쳐다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가 잠실구장 광고료를 독식해도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LG와 두산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사장이 이윤창출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야구단을 운영하다보니 소비자나 공급자가 아닌 땅주인이 돈을 긁어가는 구조가 정착돼가는 것이다.
|
◇거안사위(居安思危) 망각하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2012년 700만 관중시대를 연 프로야구는 지난해 600만명 대로 소폭 감소했다. 경기력과 인프라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구단이 느끼는 위기감이 다른 기업체만큼 클지는 의문이다. 잘 나갈 때일수록 위기를 생각해야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를 망각하면, 30년 이상 걸어온 홍보 외길인생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경영학도들은 ‘기업을 운영해 재화를 축척하면 이를 다시 사회에 재투자 해 인류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것’을 경영의 정의라고 배운다. 안타깝게도 프로야구는 구단을 경영하는 사람이 없다. KBO 총재 역시 구단 사장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일원에 그칠뿐 프로야구를 이끌 확실한 권한은 없다. 프로야구를 이끌어나갈 리더가 없는데 종사자들의 주인의식이 있을리 만무하다. 수 백만이라는 관중수,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의 최종순위 등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의 리더들은 숫자에 도취돼 일희일비 한다. 철옹성 같던 통신기기업체 노키아나 PC 최강자로 손꼽히던 IBM 등도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애플사를 굴지의 기업으로 이끈 고(故) 스티브 잡스는 “기존 기업들이 해 오던 방법과 다르게 해야 (시장에서)생존이라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년기(壯年期)에 접어든 프로야구도 이제 ‘생존’을 위해 홀로서기를 할 때가 됐다.
장강훈기자 zzang@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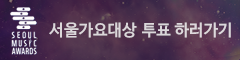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SS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wyzmob/timg/l/20140106/l_2014010601000184300009201.jpg)
![[SS포토] LG 유광점퍼 사러 가자.](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wyzmob/timg/l/20140106/l_2014010601000184300009202.jpg)
![[SS포토] 이틀 연속 매진된 창원 마산야구장](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wyzmob/timg/l/20140106/l_2014010601000184300009203.jpg)












![‘동성 키스신’으로 화제 모았던 혜리, 이번엔 파격 비키니 뒤태 공개[★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3/A1500415_5_20250313134655.png)





![K-POP 최고를 가린다…제34회 서울가요대상 본상 투표 24일 시작 [34th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1921d3a0042f451981c3bde33db697c4_P1.jpg)

![[이주상의 e파인더] 로드걸 모델 안나경, 모델계 최강미모로 로드FC 072 접수중!](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16/news-p.v1.20250316.86dd168080894a09bf1dc5a4926827c1_P1.jpg)




![[단독] ‘최강야구’ 서동욱, 전직 프로야구선수의 베스트셀러 도전기…야구 상식 에세이 ‘야구는 눈치게임’ 출간](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26/news-p.v1.20250326.a5d9e8ef8d1c4048b3c5430c46d606b7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