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칼럼니스트] 경기가 시작됐다. 1번타자가 볼넷을 골라서 1루에 나갔다. 2번타자가 번트자세를 취했다. 캐스터와 해설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번트 자세입니다.” “2번 타순은 작전수행능력이 좋은 선수가 배치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2번 타자는 희생번트 성공률도 높습니다.” “감독은 선취점의 의미를 매우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1회부터 번트를 지시한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4~5년전만해도 거의 매일 들어왔던 중계방송 단골 레퍼토리다. 그러나 타고투저의 시대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각 팀의 사령탑들은 경기 초반 번트를 지양하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번트’는 존재한다. 반드시 한 점이 필요한 상황, 예를 들면 에이스 투수 간의 선발 맞대결에서 선취점을 내려 할 때나 경기 후반 한 점 뒤진 상황에서 동점을 만들려 할 때, 아슬아슬한 한 점차 리드에서 탈출하고자 할 때 등이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과연 옳은 것일까?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 기대득점의 개념을 다시 한 번 꺼내 본다.
기대득점은 아웃카운트 별 주자 배치상황에서 나온 총 득점을 각 상황의 총 기회로 나눈 값이다. 또 각 상황이 득점으로 연결된 비율을 계산하는 기대득점 비율이 있다. 이 두가지를 검증하면 희생번트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기대득점비율은 국내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메이저리그(ML) 기록을 바탕으로 들여다봤다.
|
지난해 정규시즌에서 희생번트가 나오는 상황에서의 기대득점을 산출했다. 무사 주자 1루(1.031점)에서 1사 주자 2루(0.865점)보다 득점이 많았다. 또 무사 2루(1.375점)에서 1사 3루(1.105점) 보다 더 많이 득점했다. 무사 1, 2루(1.823점)에서는 1사 2, 3루(1.502점)보다 더 많은 점수가 나왔다. 희생번트 유무를 떠나 단순히 아웃카운트와 주자 상황만 두고 산정한 기대득점이지만 번트를 대 주자를 한 베이스 더 보냈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무사 1루나 무사 1, 2루 등에서 기대득점이 높았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15년 ML 정규시즌에서 산출한 기대득점 비율도 비슷했다. 무사 1루가 49.9%로 1사 2루(44.7%)보다 높았다. 다만 무사 2루(65.6%)보다는 1사 3루(66.6%)의 기대득점 비율이 높았고 무사 1, 2루(64.9%)보다 1사 2, 3루(66.6%)의 기대득점 비율이 높아 지난해 KBO리그의 기대득점과 조금 달랐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무사 1루에서는 번트가 오히려 득점빈도를 5% 이상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무사 2루와 무사1, 2루에서 번트는 득점성공비율을 근소하게 높일 수 있지만 기대득점에서 확인한 것처럼 기대할 수 있는 득점량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위 기록들을 종합해볼 때 딱 한 점이 필요한 경우 번트를 대야하는 상황은 무사 2루 정도로 한정시켜 볼 수 있다.
|
무사 1루에서 번트는 아무리 반드시 한 점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지양해야 할 개념이다. 그럼에도 번트는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ESPN 시절부터 세이버매트릭스를 방송에 적용했던 MLB 네트워크의 캐스터 브라이언 케니는 그의 저서 Ahead of the curve에서 감독이 번트를 지시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하며 “그냥 두면 되는데 이럴 경우 득점 과정에서 감독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경기에 개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ML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된 통산 1480승의 얼 위버 감독은 투구, 수비, 3점홈런을 강조했다. 수비를 탄탄하게 하면서 감독이 개입하지 않고 경기를 끌고가다보면 경기를 뒤집는 결정적인 3점홈런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철학일 뿐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 위버 감독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도 감독의 지나친 경기 개입이 경기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다.
SBS스포츠 아나운서
기사추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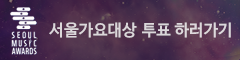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포토]신본기, 신중한 번트~](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18/07/16/news/2018071601000785400056991.jpg)
![[포토]오태곤, 피치아웃 상황에서 번트 시늉~](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18/07/16/news/2018071601000785400056992.jpg)
![[포토]번트시도 한동민 \'이런 볼이 뜨다니\'](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18/07/16/news/2018071601000785400056993.jpg)
















![‘동성 키스신’으로 화제 모았던 혜리, 이번엔 파격 비키니 뒤태 공개[★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3/A1500415_5_20250313134655.png)

![K-POP 최고를 가린다…제34회 서울가요대상 본상 투표 24일 시작 [34th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1921d3a0042f451981c3bde33db697c4_P1.jpg)


![‘원조 비키니여신’ 강하빈, 카리스마 넘치는 블랙의 마력! [이주상의 e파인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4/13/news-p.v1.20250413.9530307f08254e35b5d7732134a3c394_P1.jpg)



![“예술이다” ML도 반한 이정후 ‘스윙’…배트 스피드 ‘평균 이하’인데 왜 잘 칠까 [SS시선집중]](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4/14/news-p.v1.20250414.535e0cedc2154b50ac5cf3127c728912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