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고진현기자]종교처럼 민감한 게 또 있을까. 한국과 같이 주도적 종교가 없는 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종교가 다원화된 사회에선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공존의 터전을 마련해야지 배타적 입장에서 각자의 믿음에 날선 칼을 겨눈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큰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의 국정감사에서 민감하기 그지없는 종교적 문제가 터져나와 눈길을 끌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종교적 편향성이 마침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맡고 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야 누가 탓하랴마는 문제는 한국 체육계의 수장이 특정 종교에 편향된 인사를 일삼았다면 그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
스포츠에서 종교는 지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민감한 문제다. 스포츠는 차별 없는 자유지대에서 마음껏 유영(游泳)해야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이다. 올림픽헌장 제 27조 6항에 명시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정치, 종교,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금과옥조 역시 종교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스포츠 정신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마련된 조항이다.
이 회장이 타종교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피해를 입힌 적은 결코 없다. 그렇다고 이 회장의 종교적 편향성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국감에서 지적된대로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부임 이후 도드라진 종교적 편향 인사를 단행한 게 사실이다. 체육계 내부에서조차 이 회장의 종교적 편향성에 우려의 빛을 나타내곤 했다. 체육의 중심으로 서야할 대한체육회가 최근 갈짓자 행보를 걷고 있는 결정적 이유도 따지고보면 인사의 공정성 훼손 때문이다. 선거공신들이 요직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 종교적 커넥션이 작동해 인사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의 체육회는 총체적 위기다. 오랫동안 체육회를 출입한 기자의 눈에 체육회 전체가 셧 다웃된 모습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느 조직이나 늘 문제가 있게 마련이지만 시스템 전체가 붕괴돼 ‘식물 체육회’로 전락한 것은 아마도 ‘이기흥호’가 처음인 듯하다. 대다수 구성원들의 마음이 체육회라는 조직을 떠난 이유는 인사가 결정적이다. 선거공신을 챙겨주는 정실인사(情實人事)도 문제였겠지만 종교적 편향성이 반영된 어처구니 인사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이 회장은 한국 사회에선 보기 드문 입지전적 인물이다. 별 다른 스펙없이 자수성가해 체육과 종교, 두 분야의 거두(巨頭)가 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체육과 종교는 정치의 권력적 속성과는 한 발 비켜나 있지만 여차하면 정치의 유용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이 회장이 체육과 종교를 절묘하게 엮어 한국 사회의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체육과 종교는 순수해야 할 영역이지만 여야를 넘나드는 이 회장의 전방위적 활동(?)은 체육회장으로서 가야할 길과는 다소 멀어 보인다는 게 체육계의 뼈 있는 지적이다.
바로 서야할 체육회가 갈짓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고언(苦言)은 오직 하나다. 체육계로 입성할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며 체육이라는 한 길에 순수한 열정과 애정을 쏟아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첫 걸음은 이 회장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종교적 편향성을 불식시키는 단호한 의지 표명이 됐으면 좋겠다. 체육회장으로서 종교적 문제가 불거진 이상 이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종교는 늘 그렇듯 민감하면서도 파괴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해당 종교계의 입장에선 두 직책을 함께 수행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체육계는 그렇지 않다. 다양한 종교를 포용해야할 체육회장이 종교적 편향성으로 인해 흠집이 났다면 당연히 신도회장직은 내려놓는 게 옳다. 기능으로 존재해야 할 종교가 외부에 칼을 쥔 모습으로 비쳐지면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그건 바로 권력이다.
부국장 jhkoh@sportsseoul.com
기사추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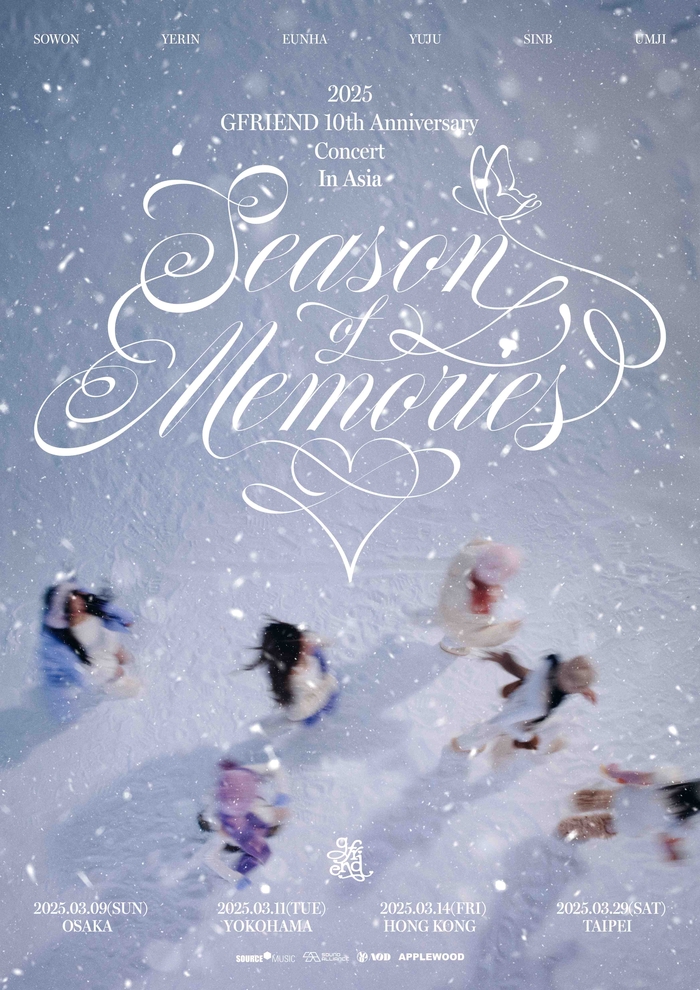




![‘차세대 빅리거’ 양민혁, 런던 입성…위대한 도전 스타트 “준비 끝났다, 손흥민 선배와 뛰는 건 영광” [SS현장]](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4/12/16/news-p.v1.20241216.81ffe2a3df4b464794ba05ab9c8b3f3b_R.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