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고진현기자]영구불변의 제도란 없다.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가 더이상 시대에 맞지 않을 때는 변화의 싹이 트게 마련이다. 제도가 시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사회적 진보의 결림돌이 되거나 구성원들의 삶에 피해를 입힐 경우, 제도는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제도 또한 원칙에 따라 만들어져야 할 게다.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담아내야 하며 이 또한 합리적 절차와 방법을 거치는 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소년체전 폐지론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소년체전이 시대정신에 역행하거나 시민사회의 눈높이와 현격하게 맞지 않은 점도 없건만 작은 문제점을 부풀려 침소봉대하는 기류는 한국 체육의 미래를 놓고 볼 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필자의 소신이다.
소년체전은 지난 1972년 도입됐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대한체육회장에 올라 1971년까지 한국체육을 이끌었던 소강(小崗) 민관식 선생이 1972년 문교부 장관이 된 뒤 창설한 게 바로 소년체전이다. 소년체전을 체육정책이라고 판단하면 무지의 소치다. 단순히 체육 경기력을 떠나 한국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의 잠재력을 체육의 교육적 가치로 계발하자는 게 소강의 소년체전 도입 배경이기 때문이다. 한국 체육 근대화의 초석을 닦은 소강이 문교부 장관이 되면서 창설한 소년체전은 시대를 견인하는 프런티어의 역할을 100% 수행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한국 체육은 소년체전 도입과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레슬링 양정모가 1976몬트리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첫 금메달의 위업을 이룬 뒤 한국 체육은 지금도 그 여세를 몰아 기적의 퍼포먼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세계만방에 태극기의 존재감을 심어준 한국 체육은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줬고 국민 통합과 국가위상의 제고라는 또 다른 사회적 기능도 충실히 수행했다. 양과 질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한 한국 체육에서 소년체전의 공로는 더이상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절대적이다. 그랬던 소년체전이 돌연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건 어찌보면 비극이다.
한국의 소년체전이 시대를 선도한 역사성을 떠나 아직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유효한 제도라는 건 눈을 돌려 세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중국이 한국을 벤치마킹해 소년체전을 도입한 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국제 스포츠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기구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난 2010년부터 유스올림픽을 창설한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일까. 세계가 우리의 소년체전을 너도 나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는 이를 없애자고 난리를 치는 광경은 그야말로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소년체전 폐지론은 한마디로 의도가 있는 정치적 기만이다. 소년체전을 시대에 맞게 개편하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나 폐지론자들은 줄기차게 그 형식을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돼있다. 초등부를 없애고 중학부와 고등부를 한데로 모아 학생축전을 만들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인 모양인데 그 숨은 의도는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드러난 문제점, 즉 내용을 개편하는 것보다 내용을 담는 형식을 바꾸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형식의 변경은 소년체전의 주최권과 그와 관련된 예산을 빼앗겠다는 불편한 생각과 맞닿아 있다. 이는 곧 대한체육회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다. 체육은 정치가 아니다. 체육의 정책적 대상을 권력의 쟁투로 여겨선 곤란하다. 정치와 권력의 색안경을 끼고 체육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체육의 바른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다. 소년체전 폐지론에 어른거리는 검은 그림자에 걱정스런 시선이 모아지는 이유다.
부국장 jhkoh@sportsseoul.com
기사추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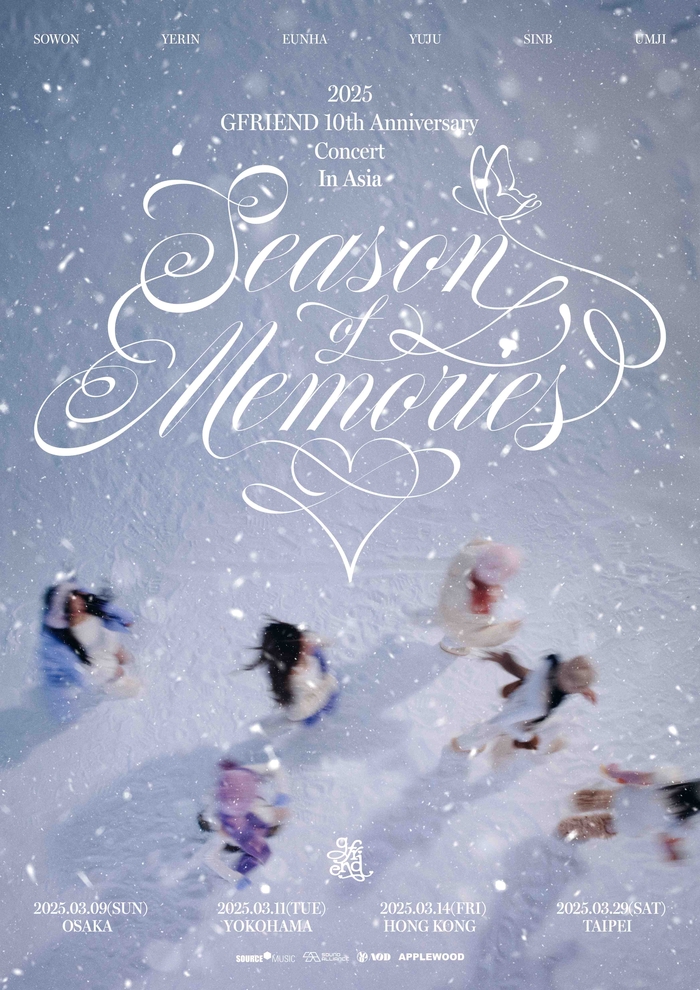




![‘차세대 빅리거’ 양민혁, 런던 입성…위대한 도전 스타트 “준비 끝났다, 손흥민 선배와 뛰는 건 영광” [SS현장]](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4/12/16/news-p.v1.20241216.81ffe2a3df4b464794ba05ab9c8b3f3b_R.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