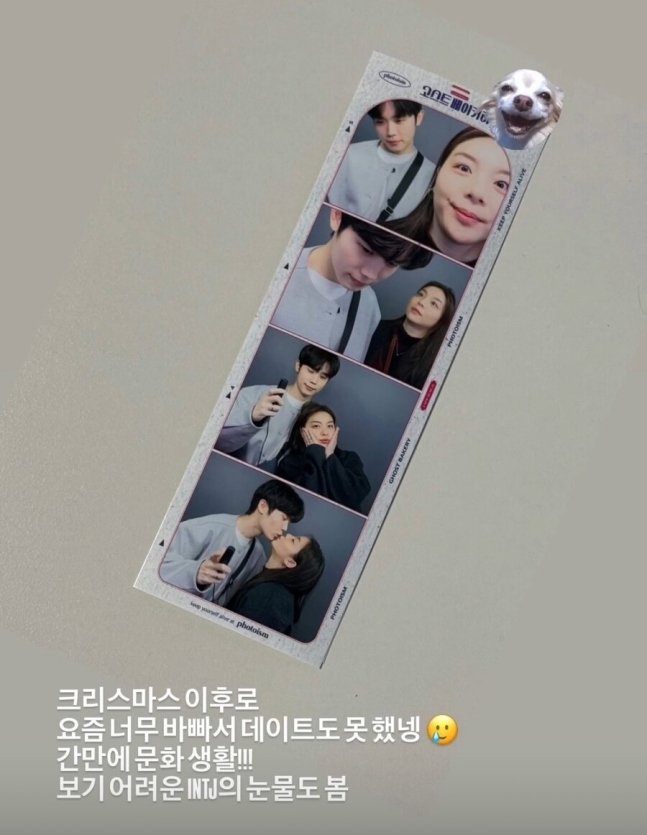[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1998년이니까 25년 전 얘기다.
아마추어끼리 경쟁하던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에 처음 프로 선수들의 참가를 허용했을 때다. 병역혜택이라는 ‘당근’을 가진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은 일본, 대만 등쌀에 등 터지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른바 ‘드림팀’을 꾸렸다.
당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박찬호(당시 LA다저스)를 비롯해 빅리그가 탐내던 서재응, 임창용 등 프로 정예 멤버로 대표팀을 꾸렸다. 박한이(당시 동국대) 신명철(당시 연세대)를 비롯한 탈(脫) 아마추어 선수들도 40% 이상 선발해 프로-아마 올스타로 아시안게임에 나섰다.
대만과 치른 예선 첫 경기에서 한국은 7회 콜드게임 승리를 따냈다. 프로 출전을 허용했지만,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탓에 슬러거들의 배트 중심에 맞은 타구는 탁구공 날아가듯 뻗어나갔다.
아마추어 세계에서는 아시아 맹주를 자부하던 대만으로서는 충격파가 꽤 컸다. 물론 한국은 전승으로 금메달을 따냈고, 이 대회에서 병역혜택을 받은 박찬호를 포함해 서재응 김병현 등 ‘코리안 메이저리거’ 러시를 이루는 촉매제가 됐다.
‘합법적 병역브로커’라는 우스갯소리는 IMF시절을 관통하던 1998년 방콕에서 뿌리를 내린 셈이다.
3일 대만은 4만명이 입장할 수 있는 타이페이 돔에서 국제대회를 치렀다. 2009년 2011년 등 첫삽을 뜬 시점은 분분하지만, 10년 이상 걸려 완공한 나름 최신식 돔이다. 대만계이지만 일본프로야구에서 전설로 자리매김한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오 사다하루 회장이 역사적인 개막식에서 시구하며 눈길을 끌었다. 애스트로 돔 등 메이저리그 초창기 돔구장을 연상케하는 그라운드로 눈길을 끈 타이페이 돔에서 대만은 ‘숙적’ 한국과 국가대표 경기를 오프닝 매치로 선택했다.
23세 이하 젊은 선수로 구성한 대표팀이 ‘아시아 맹주’를 가리기 위해 치르는 아시아선수권대회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올해만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항저우 아시안게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등 세 개의 국제대회를 치렀는데, 이번 대회는 아마추어리즘이 가장 강하게 투영한 무대여서 눈길을 끌었다.
한국 대표팀은 1군경험이 전무하다시피한 2군 선수들과 일부 대학생으로 팀을 꾸렸다. 지휘봉도 동의대 정보명 감독에게 맡겼다. 순위도 중요하지만, 어린 선수들이 국제경험을 쌓아 프로에서 더 좋은 기량을 펼치자는 의미가 담긴 선발로 보였다.
박빙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국제대회는커녕 돔구장 경험도 거의 없는 한국은 사실상 ‘젊은 올스타’로 맞선 대만에 완패했다. 장단 10안타로 4점을 내준 마운드보다 9회까지 단 4개의 안타만 빼앗아낸 타선은 한국 아마추어 야구(프로 2군 포함)의 현실을 대변하는 듯했다.
특히 수비에서 기록되지 않은 잔실수는 한국 야구가 기본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씁쓸함을 안겼다. 프로라고는 해도 마이너리거와 대만프로야구 영건으로 구성한 대만 대표팀에 ‘매운맛’을 한 개도 보여주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모습은 25년전 한국의 ‘드림팀’에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완패한 대만을 떠올리게 했다.
경험부족, 낯선환경 등 핑계거리는 많다. 분명한 것은 같은 연령대 타국 선수보다 한국 선수들의 기본기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WBC와 아시안게임, APBC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이번 대회 첫날부터 종합선물세트처럼 쏟아졌다. zzang@sportsseoul.com
기사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