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폭싹 속았수다’는 눈물을 쏙 빼는 대사가 많다. 임상춘 작가의 유려한 필력은 ‘쌈, 마이웨이’(2017) ‘동백꽃 필 무렵’(2019)을 거쳐 이번 작품에서 만개했다. 스포츠서울이 가슴을 후벼파는 명대사·명장면 3가지를 꼽았다.
◇봄(1회) “어망 하루 내가 사고 싶네”→“어떻게 나한테 요런 게 걸려”

애순의 엄마 광례(염혜란 분)는 잠녀(潛女)다. 바닷 속에서 전복을 캐온다. 물질하느라 하루 종일 바다에 잠겨 산다. 문학소녀 애순은 이런 일상을 담담히 적는다. 엄마를 하루 종일 볼 수가 없기에 엄마를 쉬게하고픈 바람도 적는다. 광례의 두 볼은 눈물로 젖는다.
허구허날 점복 점복/ 태풍와도 점복 점복/ 딸보다도 점복 점복/ 꼬루룩 들어가면 빨리나 나오지/ 어째 까무룩 소식이 없소/ 점복 못 봐 안 나오나/ 숨이 딸려 못 나오나/ 똘내미 속 다 타두룩/ 내 어망 속 태우는/ 고 놈의 개점복/ 점복 팔아 버는 백환/ 내가 주고 어망 하루를 사고 싶네/ 허리 아픈 울 어망/ 콜록대는 울어망/ 백환에 하루씩만 어망 쉬게 하고 싶네
자랑할 만하다. 콩알만한 게 동시로 감동을 주다니. “너는 있어? 요런 딸내미 있어? 어떻게 요런 게 나한테 걸려”라는 광례의 말은 자식을 목숨줄로 삼고 하루하루 자맥질을 한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여름(6회) 자식 잃은 슬픔→‘살민 살아진다’

“안아줄 걸. (그때) 안아볼걸 ”
점심밥 먹인 자식이 저녁에 차갑게 돌아왔다. 애순은 바다가 삼킨 셋째 동명이의 수저를 두손으로 꼭 붙들고 오열했다. 치우지 못한 밥상 앞에서, 땅바닥이 꺼지도록 울음을 삼켰다.
자식이 죽었다. 명치 끝에 남았다.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다. 평소 고깝게 여기던 시어머니 계옥(오민애 분)도 이번만은 달랐다. “살어야지 어쩌겠니. 네 입만 쳐다보고 있는 산 자식이 또 둘”이라며 위로를 건넸다.
“살암시민 살아진다. 살민 살아져”
죽은 광례가 꿈에 나왔다. “살다가 똑 죽겠는 날이 오면 누워있지 말고 죽어라 발버둥을 치라”고 말이다. 누워있던 애순과 관식을 벌떡 일으킨 건 자식인 금명이와 은명이었다. 둘은 동명이의 죽음을 자책했다. 그런 자식을 보며 그늘지게 살게해선 안 되겠다 다짐했다. 관식은 바다로, 애순은 부엌으로 일상으로 돌아갔다. 여름 태풍에 다 넘어갔던 풀과 나무가 기어코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다.
◇가을(11회) “많이 받고도 작은 걸로 퉁”

금명(아이유 분)은 사랑을 받고 따뜻하게 컸다. 서울은 달랐다. 육지는 섬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월세는 비쌌다. 겨우 구해 들어간 하숙집에선 눈칫밥을 먹고 살았다. 구들장의 바닥이 까맣게 돼 틈이 보일락말락 할 때였다. 애순(문소리 분)의 꿈엔 자꾸만 죽은 동명이가 나왔다.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서울로 보낸 자식의 안위가 걱정되던 찰나, 애순이 문을 연 방에는 매쾌한 일산화탄소가 가득했다.
자식을 또 잃을 뻔했던 애순.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 금명은 제주집으로 내려와 며칠을 묵는다. 사랑도 떠나보낸 금명은 늘 자신을 일으켜세워준 부모에게 몰래 선물을 주고 떠난다. 굳은 살이 박힌 관식에게는 핸드크림을, 애순에겐 시를 쓰라며 노트를 주고 떠난다.
부모는 울었다. 많은 걸 다 퍼주고도 자식이 주는 자그마한 선물에 가슴이 뛴다. “많은 걸 받고도 작은 걸로 퉁”이라는 금명의 내레이션이 가슴을 친다. 세상 불공평한 관계, 그게 부모 자식 관계다. socool@sportsseoul.com
기사추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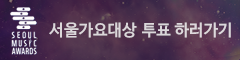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조재현 딸’ 조혜정, 칸 빛낸 핑크빛 드레스 자태…감출 수 없는 볼륨감 [★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5/A1512590_9_20250504101516.png)















![실화입니까? ‘캡틴’ 손흥민 정중앙서 트로피 번쩍!…韓 유럽파 새역사→꿈은 이뤄졌다 [토트넘 UEL 우승]](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5/22/rcv.YNA.20250522.PAF20250522157401009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