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걸리는 자고이래로 서민의 술이다. 귀족이 아닌 평민이, 양반이 아닌 서민이, 유생이 아닌 농민이 집에서 쌀을 빚어 직접 담궈 먹던 술이다. 제사를 지낼 때 마시는 우아한 차례주가 아니라 모내기, 김매기, 타작과 같은 농사일을 할 때 마시던 걸죽한 농주이기도 했다.
옛 사람들이 막럴리를 가장 많이 마시던 계절은 언제였을까? 아마 지금과 같은 늦가을 무렵일 것이다. 굳이 역사서나 옛 문헌을 찾아볼 필요도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온다. 봄이나 여름에 서민들이 막걸리를 많이 빚었을 것 같지는 않다. 춘궁기, 보릿고개 등의 단어가 실생활에서 사라진지 수십년이 채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먹을 쌀도 없는데 그걸로 술을 빚을 만한 여유가, 서민들에게 있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쌀을 수확한 직후 무렵 막걸리를 빚고, 그 맛을 즐기는 이들이 가장 많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쌀 추수가 끝난 직후, 농한기가 시작될 무렵인 11월이야 말로 본격적인 ‘막걸리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갓 수확한 햅쌀이야 말로 전통적으로, 막걸리을 빚을 때 활용한 원재료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국순당 ‘햅쌀로 빚은 첫술’, 막걸리의 원형을 느낀다
국순당이 2013년 수확한 햅쌀로 빚은 프리미엄 생막걸리 ‘햅쌀로 빚은 첫술’은 여러 의미에서 막걸리의 원형을 엿볼 수 있는 제품이다. 일단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막걸리 양조장에서 올 가을 첫 수확한 그 지역 햅쌀을 활용해 빚은 술이다. 또 프랑스의 보졸레 누보처럼 매년 그 해의 첫 재료(햅쌀)를 써 일정기간에만 마실 수 있는 계절 한정용 제품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 제품은 총 5000병만 생산됐으며 11월 단 한달 동안만 즐길 수 있다. 옛 서민들이 농사를 다 지은 직후 맛보던 바로 그 느낌을 살린 것이다.
◇유리병에 담긴 부드러운 유혹, 갓지은 쌀밥의 향이 솔솔
이 제품은 일단 첫인상이 좋다. 예쁜 유리병에 담긴 모습이, 좋은 의미에서 ‘막걸리스럽지’ 않다. ‘햅쌀로 빚은 첫술’은 목이 좁은 유리병에 담긴 본새가 고급스러워서, 첫인상 만으로 술맛이 살아난다.
막걸리를 제조 공정상으로 나누면 생막걸리와 살균막걸리로 구분이 가능하다. 생막걸리는 탄산이 강하고, 매콤한 음식에 더 어울린다. 살균막걸리는 탄산이 없는 대신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이고, 상대적으로 담백한 음식과 통한다.
‘햅쌀로 빚은 첫술’은 생막걸리 치고는 목넘김이 부드럽다. 탄산이 살아있으면서도 맛은 생막걸리와 살균막걸리의 중간 정도였다. 색깔이 약간 투명한데 맛이 흐리진 않았다. 알코올 도수가 7도(일반적인 막걸리는 대부분 6도)로 다른 제품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독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다. 아주 매운 음식보다는 살짝 매콤한 두부김치나 고소한 전류, 새콤달콤한 음식과 궁합이 좋을 듯 했다.
◇일반인의 시음평 “부드럽고 젊은 느낌”
서울 시내의 한 대중음식점에서, 미리 양해를 구한 뒤 직접 가져간 ‘햅쌀로 빚은 첫술’을 일행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닭볶음탕을 먹던 젊은 직장인 여러 명이 음식점 종업원에게 우리와 같은 술을 달라고 요청했다. 종업원이 “저분들이 직접 가져온 술”이라고 말하자 아쉬워하는 눈치길래 우리 일행이 가져간 술 중 한병을 준 뒤 정중히 품평을 청했다. 한 여성은 “옆테이블에서 보니 막걸리 병이 너무 예뻐서 우리도 마셔보고 싶었다”며 “젊은 느낌이다. 도수가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부드럽다”는 평을 했다. 한 젊은 남성은 “여성을 만날 때 ‘작업주’로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제품은 용량이 750㎖로 냉장 유통된다. 대형유통매장이나 일부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계절 한정이라는 제품의 특성상 일반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볼 수 없다. 소비자 판매가는 4400원. 같은 용량의 일반적인 막걸리보다 4배 정도 비싸다. 지금 이 시기에만 맛 볼 수 있다는 희소성을 높이 사는 막걸리 애주가라면 마셔볼 만한 제품이다.
이지석기자 monami153@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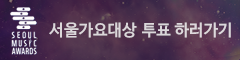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서울가요대상’ 빛나는 3차 라인업 공개! 도영·제로베이스원·아일릿 등 참석 [34th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5/25/news-p.v1.20250525.05739b64bbb44ebdb51c713edc6eb789_P1.png)






![“허벅지 뒷편 불편 느껴” 삼성 김성윤, 2타수 2안타 후 교체…“아이싱 중, 상태 지켜본다” [SS메디컬체크]](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5/30/news-p.v1.20250521.471eb55d6a62477b9fc4dbeb6c3d226f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