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저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내 야구인기는 이전만 못하고 야구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의 숫자도 그에 비례해 줄었다. 현 구조상 야구를 시작하면 야구에 몰빵해야 하는 상황도 부담스럽다. 과거처럼 가족이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시대도 아니다. 게다가 직업야구인으로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부모가 선듯 나서기도 힘들다.
세태가 변한 상황에서 야구 저변을 확대하려면 수십년간 이어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야구 뿐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나 예술을 하려면 여전히 돈이 많이 든다. 기본적인 장비 구입부터 단체훈련, 개인레슨, 지도자접대 등 여러군데 돈이 들어간다. 전지훈련이라도 한 번 가면 수백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틀 자체를 부숴야 한다. 시대의 요구다.
야구가 지향해야 할 롤모델로 동네마다 있는 태권도장을 들고 싶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낸다. 심신 단련에 좋고 한 달 회비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부모 입장에서 그 정도 비용이라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 태권도장에 간다. 피아노 학원도 가고 미술학원도 간다.
|
야구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수업 끝나고 학원갈 시간에 야구하면 된다. 경기 역시 주말이 아닌 평일 오후에 하면 된다. 굳이 수업 빠지면서 오전부터 안해도 된다. 오후엔 학교수업이 끝난 뒤라 비어있는 운동장 확보가 쉽고 여름이면 더운 날씨를 피할수도 있다. 야구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축구장을 반으로 나누면 초등 규격의 야구장은 2개가 나온다. 또한 권역별로 대회를 많이 만들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야구경기를 할 수 있다.
최근 스포츠혁신위에서 학생 선수들의 대회출전 결석허용 일수를 줄였다. 경기단체를 비롯한 학생선수의 부모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승민 IOC위원도 “방학에만 국제대회에 참가해야 하냐”며 분노했다. 그 주장도 일리 있다. 종목별 특징이 있고 선수생명도 상이하기에 두부 자르듯 일괄적용하면 안된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공부 다하고 운동하는게 장기적으로 맞다.
스포츠는 잘 하기 위해선 ‘좋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좋아해야 잘 할 수 있다. 결석일수 조정보다 그게 더 중요한 충족조건이다. 그러나 국내 학생선수는 초등학교부터 성적에 목을 매야 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출발부터 저변이 확대될 수 없는 구조에 묶여 있다.
엘리트 체육이 죽는다고 하지만, 이들의 미래도 일부를 제외하곤 비정규직이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이 계속된다. 한곳만 팠기 때문에 전문성은 높아도 다양성은 떨어진다. 이들은 엘리트 선수가 아닌 전문 선수라고 부르는게 타당하다. 스포츠선진국을 보면 변호사, 회계사, 펀드매니저가 야구선수로 뛴다. 그런 경우라면 엘리트 선수라 부를만 하다.
우리사회에서 진정한 엘리트 선수의 탄생은 아직까지 숙제와 같다. ‘비체육 전공자’ 엘리트 선수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체육인만 목소리를 내다보니 대중을 설득하지 못한다. 결국 그들만의 메아리에 그친다.
|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많은 아이들이 여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직업선택을 하는 것처럼 그 이전까진 ‘몰빵’을 지양해야 한다. 한 곳에 올인하면 대안은 사라지고 실패확률만 높아진다. 스포츠 교육은 몰빵이 아닌 다양성이 뼈대를 이뤄야 한다. 그 연장선에서 학업 또한 아이들이 경험해야 할 다양성 중에 하나다.
학생선수와 야구인들이 바라는 저변 확대는 학년별 다양한 레벨의 활성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야구종사자들은 구태의연한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리 보전이 아닌 야구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많은 아이들이 야구를 할 수 있다. 성적 지상주의에 편승한 엘리트 타령만 하지 말고 동네마다 있는 태권도장에서 배워야 한다. 저변이 확대되면 엘리트 선수는 자연스럽게 탄생한다.
kenny@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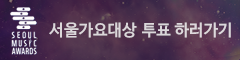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동성 키스신’으로 화제 모았던 혜리, 이번엔 파격 비키니 뒤태 공개[★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3/A1500415_5_20250313134655.png)



![K-POP 최고를 가린다…제34회 서울가요대상 본상 투표 24일 시작 [34th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1921d3a0042f451981c3bde33db697c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