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2022년 새해가 밝았다. 프로야구가 세상의 빛을 본지 40년째 되는 해로, KBO리그도 어느덧 불혹을 맞이했다.
국내 최초의 프로야구단 OB(1월 15일 창단)를 시작으로 MBC(현 LG·1월26일) 해태(현 KIA·1월 30일) 등이 1982년 1월에 창단식을 열었고, 삼성(2월 3일) 삼미(2월 5일) 롯데(2월 12일) 등 6개 구단이 프로야구 원년 구성원으로 공식 등록했다. 원년에는 수, 목, 토, 일요일 등 주 4경기를 기본으로 팀당 80경기 총 240경기 체제였다. 개막전 끝내기(MBC 이종도), 한국시리즈 끝내기(OB 유두열)뿐만 아니라 올스타전(3차전·롯데 김용희)에서까지 만루홈런이 터져나와 프로야구의 인기몰이와 연착륙을 끌어냈다. 원년 213만명이던 총관중 수(포스트시즌 포함)는 프로야구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다.
|
그러나 당시와 현재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구단의 적자다. 심지어 프로 원년에는 정부가 ‘각 구단이 흑자를 내기 전까지 면세한다’고 약속했을 정도다.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어 야구 선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올겨울 프리에이전트(FA) 몸값 총액만 971억원에 이를 만큼 확장했지만, 구단의 적자 폭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시장 규모가 커진만큼 매출은 증가했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마이너스다.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두산과 LG는 야구장 광고수익으로 고작 23억원 내외를 버는 게 전부다.
롯데와 키움이 올겨울 FA시장에서 팀 간판선수를 빼앗긴 배경은 이른바 FA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키움은 코로나 직격탄으로 수십억씩 투자해야 하는 FA시장에 참전할 엄두도 못냈다. 그룹 사정이 좋은 KIA NC LG 등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한국 프로야구의 구조적 폐단이기도 하다.
|
KBO 정지택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40년간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쉼없이 달려온 KBO리그가 코로나로 지친 팬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팬과 소통을 강화하고, 경기력 향상, 아마추어 지원 등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리그 산업화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구단 자생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리그의 양적 질적 확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대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2016년)했지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시설 혹은 토지는 여전히 지자체가 관리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일반재산도 임대 또는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프로스포츠 구단이 연고 경기장을 활용해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고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여가·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환경의 급진적인 변화로 각 구단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구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야구장이 있는 체육시설이 프랜차이즈 시민들의 생활·문화·놀이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가능하다. 쇼핑, 영화관람뿐만 아니라 MZ세대가 즐길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구단이 임대해 경영하는 시스템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법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KBO가 머리를 맞대 방법을 찾아야 한다. 3월에는 대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발전과 퇴보의 갈림길에 서 있는 불혹의 KBO리그다.
zzang@sportsseoul.com
기사추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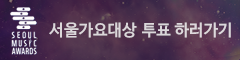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포토]창단 첫 우승의 기쁨을 나누는 ㅏㅅ](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2/01/02/news/2022010201000039300001464.jpg)



![[포토] 매진된 라팍구장 \'우승 가자\'](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2/01/02/news/2022010201000039300001463.jpg)














![‘동성 키스신’으로 화제 모았던 혜리, 이번엔 파격 비키니 뒤태 공개[★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3/A1500415_5_20250313134655.png)



![K-POP 최고를 가린다…제34회 서울가요대상 본상 투표 24일 시작 [34th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1921d3a0042f451981c3bde33db697c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