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KBO리그가 출범 4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15일 OB(현 두산)가 창단 40주년을 맞았고, 26일에는 LG(전 MBC)의 40돌을 맞이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월 24일 현판을 달았으니, 두 달 남짓이면 원년 구성원들이 완전한 불혹(不惑)에 접어든다.
KBO도 창설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라이크존을 확대하고, 유소년 동계훈련(넥스트-레벨 트레이닝 캠프)을 통해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프로야구 원년 멤버간 클래식 매치 등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쇼업’에 집중하는 뉘앙스다. 통합 데이터시스템 도입이나 통합 마케팅 플랫폼 개발 등은 KBO리그가 팬 친화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KBO는 25일 이사회(사장단 회의)에서 미래 비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
불혹이면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다’고 한다. 물론 공자의 체험을 논어 위정편에 직접 기록한 것이라, 개인의 경험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2022년을 살고 있는 40대는 여전히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만큼 세상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한다는 의미다. ‘시대의 흐름’ 같은 거창한 수사가 아니어도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감을 안고 매일 사투를 해야 하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미래는 불투명하니, 청년과 중년 사이에 선 40대는 가장 치열하면서도 서글픈 세대로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정지택 총재를 위시한 사무국이 바로서야 한다. KBO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나 일본야구기구처럼 프로야구를 이끌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세상일에 정신을 팔려 갈팡질팡해서는 현재의 KBO리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구성원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보기에 화려한 ‘쇼업’보다 KBO리그가 영속성을 갖기 위한 시스템화에 집중해야 한다.
|
국가대표팀을 포함한 한국야구는 최근 4~5년 사이 세계무대의 변방으로 물러섰다. 학생야구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입 탓에 고사위기에 처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으니 너도나도 사설 아카데미로 향한다. 지방 초등학교 야구부는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지 오래다. 개인의 열정으로 고교까지 학생선수로 활동하고도 취업이나 진학에 실패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학생선수들이 야구와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유턴존’은 KBO가 중심이 돼 만들어야 한다. 어쨌든 한국야구의 중심은 KBO와 10개 구단이다.
야구를 부흥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유소년부터 성인야구까지 폭넓은 장이 열려야 한다. 프로의 영역이 아니라고 뒷짐쥐고 있으면, 프로레슬링이나 프로씨름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세대교체나 젊은 아이디어도 소중하지만, 베테랑들의 경험과 관록이 때로는 더 강한 파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국과 일본프로야구는 이미 증명하고 있다. 시류에 휩쓸려 휘청거리는 것이 아닌, 고통받고 비난받더라도 뚝심있게 야구의 본령을 지켜내는 것이 베테랑들의 힘이다. 베테랑의 힘은 불혹의 KBO리그가 도약할 기반이 된다.
|
이미 KBO리그는 ‘국보’ 선동열,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감독’ 김경문을 잃었다. ‘국민타자’ 이승엽도 중심이 아닌 주변에 머물고 있다. ‘40주년 레전드’로 추앙한 전설들은 과연 한국야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레전드가 야구 활성화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화려한 외형보다 중요해 보인다. 기업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야구단을 운영한다면, 각 구단은 야구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다.
zzang@sportsseoul.com
기사추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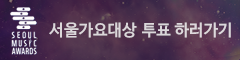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포토]KBO리그 개막 일정 결정 임박](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2/01/24/news/2022012401000980800070363.jpg)

![[포토]스포츠서울 올해의 상, 정지택 총재의 축사](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2/01/24/news/2022012401000980800070362.jpg)

![[포토] 프로야구 개막, 무관중 경기로 열려](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2/01/24/news/2022012401000980800070365.jpg)














![‘동성 키스신’으로 화제 모았던 혜리, 이번엔 파격 비키니 뒤태 공개[★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3/A1500415_5_20250313134655.png)



![K-POP 최고를 가린다…제34회 서울가요대상 본상 투표 24일 시작 [34th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1921d3a0042f451981c3bde33db697c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