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출범 40주년을 맞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중대 기로에 섰다. 수장인 총재 없이 시범경기 개막을 해야하는 처지다.
KBO 이사회(사장회의)는 오는 11일 새 총재 후보 추대를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연다. 지난 2일 몇몇 후보를 추대해 투표했지만 4분의 3 이상 동의를 구하지 못해 한 차례 연기됐다. 정규시즌 개막 전까지는 새 총재를 선임해야 한다.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잰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KBO 총재 자리가 인기가 없다는 데 있다. 총재의 권한이 제한적인 현 제도 안에서는 ‘욕받이 명예직’을 선뜻 맡겠다는 사람이 없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정몽윤 회장 등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사회의 생각은 다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그룹 경영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총수에게 KBO 총재직을 제안할 ‘간 큰 사장’이 있을리 만무하다.
|
역설적으로 그래서 오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판세에 따라 총재 후보군이 바뀔 가능성도 엿보인다. 야구계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다. KBO 총재는 안으로는 ‘욕받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꽤 주목도가 높은 직책이다. 프로야구는 매일 다섯 경기가 생중계되는 유일한 종목인데다 여전히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하다.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연간 800명 이상 관중이 들어차는 프로스포츠를 이끄는 수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포퓰리즘 마케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다.
총재 선임 시기만 되면 여야(與野)할 것 없이 정치권 낙하산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선으로 민심이 판가름나면, 정권을 잡은쪽이든 반대쪽이든 새로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구단주로 군림하는 프로스포츠에서도 대중적 주목도가 가장 높은 KBO리그의 수장을 앞세워 ‘국민의 곁에 함께 있다’는 미디어 믹스(Media mix) 실현을 대놓고 할 수 있는 점은 매우 매력적인 자리다.
|
KBO 이사회는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교체된다. 야구계 현안과 관계없이 그룹의 정기 인사로 구단 사장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사장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거나 통합우승을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총재의 가장 큰 덕목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법 없다. 그저 구단이 필요로 하는 규약 개정에 협조적인 인물인 게 대표이사 입장에선 훨씬 효율적이다. 겉으로는 ‘조정능력을 갖춘 인물’을 외치지만, 이른바 ‘톱 다운’ 형태로 규약이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인물에 선뜻 표를 던지지 않은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기업은 정부의 정책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른바 낙하산 총재가 내려오면 피곤해진다. 미디어 믹스에 포퓰리즘을 가미한 정치적 의도를 충족하려면 총재가 뭐라도 해야하기 때문이다. 정권을 등에 업은 총재의 의지를 구단 사장들이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렵다. 어쨌든 정치권이 움직이기 전에 총재를 추대하겠다는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다.
|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새 총재 추대 과정에 핀치에 몰린 쪽은 구단 사장들이다. 선뜻 나서는 인물은 보이지 않고 ‘톱 다운’ 방식으로 각종 제도나 규약을 뒤집을 만한 후보군만 있는 모양새다. 대선이 끝난 뒤 이틀 만에 열리는 이사회 개최 시점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zzang@sportsseoul.com
기사추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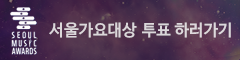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한국야구 새 수장은 누구?[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2/03/07/news/2022030701000274700018243.jpg)















![‘동성 키스신’으로 화제 모았던 혜리, 이번엔 파격 비키니 뒤태 공개[★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3/A1500415_5_20250313134655.png)



![K-POP 최고를 가린다…제34회 서울가요대상 본상 투표 24일 시작 [34th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1921d3a0042f451981c3bde33db697c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