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서울 | 광주=장강훈기자] KIA 고졸(동성고) 신인 김도영(19)은 프랜차이즈 최연소 개막전 리드오프로 나섰다. 시범경기 타격왕(0.432)에 오르는 등 신인답지 않은 경기력을 뽐내 코치진과 동료, 팬 모두 기대가 높았다.
데뷔 타석에서 처음 만난 ‘프로의 공’은 상대(LG) 1선발 아담 플럿코가 던진 144㎞짜리 패스트볼. 초구를 기다렸다는 듯 배트를 내밀었다. 빠르고 경쾌한 스윙이라, 배트 중심에 맞았더라면 KBO리그 사상 최초로 개막전 데뷔 타석, 1회말 선두타자 초구 홈런을 쏘아 올린 ‘고졸 신인’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시범경기와 정규시즌, 그것도 개막전에서는 투수의 집중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볼에 담긴 기세가 다르다. 잔뜩 힘이 들어간 김도영의 스윙은, 플럿코의 구위를 따라가지 못했다. 당연한 결과다.
큰 헛스윙으로 시작한 김도영의 개막 2연전은 9타석 9타수 무안타였다. 삼진 세 개를 당했고, 인플레이 타구 가운데 단 두 개만 공식 기록상 내야를 벗어났다. 눈길을 끈 점은 아홉 차례 타석에서 본 공이 29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첫날 네 타석에서 17개를 봤는데, 이 가운데 볼을 골라낸 것은 세 차례 뿐이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다섯 번 타석에 들어가 공 12개를 봤다. 이날은 볼을 하나도 골라내지 않았다.
|
김도영은 “투나씽(노볼 2스트라이크)이 되는 게 너무 싫다. 2스트라이크에서는 좋은 결과를 낸적이 없어, 최대한 ‘투나씽만 당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타석에 선다”고 말했다. 고교 때부터 습관일 수도, 자신의 타격 지론일 수도 있다. 살 떨리는 프로 데뷔 무대에서 타석당 3개꼴로 선배들의 투구를 지켜본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군다나 김도영은 KIA가 그토록 찾던 리드오프다. 야구 트렌드가 바뀌었다고는 해도, 리드오프가 공격의 첨병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투수를 괴롭히는 역할을 해 뒷타자들이 수월하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KIA 김종국 감독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야구를 추구한다. 초구에도 적극적으로 배트를 내밀고, 3볼에서도 자기 스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고 무모한 공격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김 감독이 추구하는 올해 타이거즈 야구는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야구’다. 승패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타이거즈는 껄끄러운 상대’라는 긴장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차피 야구는 타이밍 싸움이다. 타이밍은 호흡이 중요한데, 상대가 편안하게 호흡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 지난해까지 KIA는 산소호흡기 같았다.
|
리드오프의 적극적인 스윙은 상대 투수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타자가 덤벼들면 투수는 구속 차만으로도 쉽게 제압할 수 있다. ‘김도영은 2구 이내에 승부를 내는 타자’라는 인식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치게 하는 게 이길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타석당 3개꼴로 적극성을 띤 김도영이 놓친 부분이다. 3구 삼진을 당하더라도 스윙 대신 투수의 리듬에 타이밍을 맞추는 게 훨씬 위협적이다. 스윙 없이 타이밍만 잡고 있는 타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선배들은 안다.
이제 시작이고, 상대해야 할 투수는 많다. 구위와 구질이 다른 선배들과 만남에서 자기만의 타이밍 잡는 법부터 익혀야 자신만의 히팅 존을 정립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홈런이나 안타를 뻥뻥 때려내는 게 비정상이다. 실패 과정 속 배움이 있다면, 코치진을 포함한 동료들은 기꺼이 기다려준다. 1차지명 고졸 신인이 누릴 수 있는 특혜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담겨있다.
zzang@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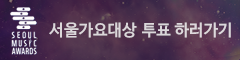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동성 키스신’으로 화제 모았던 혜리, 이번엔 파격 비키니 뒤태 공개[★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3/A1500415_5_20250313134655.png)



![K-POP 최고를 가린다…제34회 서울가요대상 본상 투표 24일 시작 [34th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1921d3a0042f451981c3bde33db697c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