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온통 무덤이다. 주로 감독들이 주인이다. 종종 거포 유망주나 화려한 이력을 가진 외국인 선수가 포함되기도 한다. 눈에 띄지 않을 뿐, KBO리그는 무덤과 공존하고 있다.
프로야구 감독은 ‘파리 목숨’이라고 한다. 성적부진으로 지휘봉을 내려놓는 경우가 꽤 잦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로 범위를 축소해도, 두산과 LG, KT를 제외한 8개 구단이 대행체제를 경험했다. 2020년에는 세 명의 감독대행이 대리청정했고, 올해도 두 명의 대행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올시즌 후 네 명의 감독이 계약 만료다. 세 팀은 상위권에 포진해 있지만, 재계약 보장이라고 선뜻 말하기 어렵다. 구단주의 선택에 성적을 내고도 해임된 전례가 있는 팀들이라 어떤 변수가 있을지 예단할 수 없다. ‘감독들의 무덤’이 더 넓어지는 추세다.
|
지난달 31일 사임한 삼성 허삼영 전감독은 우려와 기대를 한몸에 받던 지도자다. 투수로 입단해 짧은 선수생활을 마치고 전력분석원으로 전환, 2000년대 중후반 3(三)대장으로 시대를 풍미했다. 30년 동안 한 팀에 몸담으며 지켜본 감독만 9명이다. 김성근 백인천 김응용 등 원로 감독뿐만 아니라 우용득 김용희 등 프로야구 1세대 사령탑과 선동열 류중일 등 스타플레이어 출신 감독을 보좌했다.
삼성 홍준학 단장은 2019년 시즌 후 김한수 전감독과 재계약 대신 허 전감독을 선임하면서 “백네트 뒤에서 하던 업무를 더그아웃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누구보다 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인데다, 수많은 감독, 코치들과 소통하며 체득한 노하우가 상당하다. 팀을 재건하고 새롭게 도약시킬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직원을 현장으로 끌어낸 인물이 구단 경영진들이라는 뜻이다.
|
여론 압박에 감독이 버티지 못한 모양새이지만, 구단의 책임도 있다. 이른바 스케치북 검열 논란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고, 주축들의 줄부상과 팀내 불화 등에 사실상 손놓고 방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없지만, 화난 팬들에게 ‘선수단 부상 등으로 정상전력이 아니어서 재건에 힘쓰고 있다. 기다려달라’는 설명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2위나 꼴찌나 실패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주장으로 주축선수들이 재기할 시간을 벌어주고, 단계적 리빌딩에 힘쓴 선동열 전 감독을 사실상 경질한 구단이니 “팀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읍소할 명분이 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당시에는 선 전 감독의 인내심 덕분에 이른바 ‘지키는 야구’를 완벽히 재현했다. 전임감독의 인내와 ‘순혈주의로 회귀’를 선언한 구단 기조로 취임한 류중일 전 감독은 ‘삼성 왕조’를 구축한 사령탑으로 명장 반열에 올랐다.
|
5연속시즌 정규시즌 우승에 통합 4연패를 일군 감독을 내친 뒤 삼성은 ‘못해도 4강’이라는 전통과도 작별했다. 이면에는 국정농단 가담으로 쑥대밭이된 모기업의 사정이 큰 몫을 차지했다. 당사자는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5년간 기업 총수로 돌아올 수 없으니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을 기다리는 신세다. 스포츠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 노릇(호가호위·狐假虎威)을 한다. 그 속에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현장 수장인 감독이다. 구단은 늘 그렇듯 새로운 희생양을 찾는다. ‘대한민국에 단 10명뿐인 직종’이라는 감언이설로 새로운 욕받이를 옹립(?)한다. ‘감독들의 무덤’을 ‘명장의 요람’으로 바꾸는 건 구단의 몫이다. 출범 40주년. MZ세대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공동묘지의 용도변경이 더 시급한 KBO리그다.
zzang@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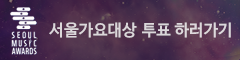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길어진 \'보크어필\'로 퇴장당하는 허삼영 감독[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2/08/02/news/2022080201000102700004942.jpg)



![[포토] LG-KIA전 지켜보는 선동열-김응용-허구연 총재](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2/08/02/news/2022080201000102700004945.jpg)














![‘동성 키스신’으로 화제 모았던 혜리, 이번엔 파격 비키니 뒤태 공개[★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3/A1500415_5_20250313134655.png)



![K-POP 최고를 가린다…제34회 서울가요대상 본상 투표 24일 시작 [34th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1921d3a0042f451981c3bde33db697c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