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선수가 없다.”
시간은 유수처럼 흐른다. 개막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KBO리그 10개구단은 40경기 남짓 남겨뒀다. 수확의 시기가 다가왔는데, 각 팀 희비는 엇갈린다. 선두나 최하위나 공과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농사 계획을 세운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선수가 없다”이다. 체력이 떨어진 게 보이지만 대체할 자원이 부족해 눈을 질끈 감고 기용하고 있다. 약점을 간파당해 슬럼프에 빠져도 일단 외면한다. 신인급 선수가 반짝 활약하기도 하지만, 풀타임을 소화하는 빈도는 매우 낮다. 그런데도 시즌은 치러야하고, 육성도 해야한다. 육성은 3~4년 전부터 KBO리그의 트렌드가 됐다.
|
KBO리그는 전통적으로 선수를 키워서 쓰는 곳이다. 어쩔 수 없다. 아마추어에서 체계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니 소위 반쪽짜리 선수가 프로에 입단한다. 자기만의 야구관은 뚜렷한데, 캐치볼을 못하는 선수가 수두룩하다. 야구관부터 바꾸지 않으면 프로에서 자리잡는 게 쉽지 않지만, 선뜻 “바꿔”라고 말하는 이가 없다. 선수가 자존심을 다치면, 코치와 신뢰가 무너진다. 어쨌든 야구는 선수가 한다. 선수를 기용하는 코치가 선수들의 눈밖에 나면, 야구가 안된다. 안타깝지만 요즘 KBO리그의 현실이다.
대부분 팀의 감독, 코치들은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다. 조금 더 열정적인 코치들은 ‘선수가 가장 좋을 때 모습’을 사진처럼 기억한다. 밸런스로 통칭하지만, 팔이 떨어졌는데, 몸이 앞으로 쏠리는지, 배트 헤드가 처지는지 등을 알고 있다. 그래도 먼저 선수에게 말하기를 꺼린다.
|
선수들은 기술적인 문제를 깜빡이 없이 훅 치고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십 수년간 야구를 해왔고, 1군에서 자리를 잡은 선수일수록 경계심은 더 강하다. 모든 선수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가 그렇다. 소프트뱅크 김성근 감독고문이 KBO리그 감독일 때 “감독, 코치는 선수들의 인기투표로 정해야 팀에 우환이 없다”고 쓴소리했을 정도다.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팀 전체로 보면 선수 자존심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중 가장 높은 가치는 ‘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승리만큼 즐거움을 주는 퍼포먼스는 없다. 팀이 승리하는 과정에 소속팀 선수가 맹활약하면 금상첨화다. 팬은 가뭄에 콩나듯 이기는 팀을 외면한다. 만년 하위팀이 모처럼 포스트시즌 진출에 다가서면, 흩어져있던 팬이 집결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만날 패하고 조롱받는 팀을 응원하는 게 유쾌한 팬은 없다.
오직 승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돈과 시간을 들여 야구를 지켜보는 팬의 마음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 프로야구는 명백한 상품이고, 상품가치를 높이는 것은 선수들의 플레이다.
|
SSG에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후안 라가레스는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 수상자다. 국내 최강 외야진으로 꼽히는 SSG 선수들 내에서도 “수비를 정말 잘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어떤 타구든 포구하는 글러브 위치가 가슴이라는 게 동료들이 말하는 ‘잘하는 수비’의 기준이다. 안정된 포구자세가 뒷받침되면, 다음 플레이로 연결도 원활하다. KBO리그 대표 외야수들 중 포구자세가 예쁜 선수는 몇이나 될까.
프로 선수들의 자세가 정석과 차이날수록 이들을 본받는 것은 프로를 꿈꾸는 아마추어들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수가 없는 게 아니다. 필사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리그 수준 저하로 이어진다. 프로야구는 이미 ‘국민 스포츠’ 지위를 잃고 있다.
zzang@sportsseoul.com
기사추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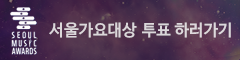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득점 김태연 \'코치님들! 줄을 서시오\'[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2/08/16/news/2022081601000719700049902.jpg)

![4회말 연속안타 내주며 무너진 김진욱, 교체하는 임경완 코치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2/08/16/news/2022081601000719700049903.jpg)
![경기전코치들과이야기나누는박진만감독대행[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2/08/16/news/2022081601000719700049904.jpg)
![[포토]조중근 코치와 홈런 세리머니를 하는 박병호](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2/08/16/news/2022081601000719700049905.jpg)














![‘동성 키스신’으로 화제 모았던 혜리, 이번엔 파격 비키니 뒤태 공개[★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3/A1500415_5_20250313134655.png)



![K-POP 최고를 가린다…제34회 서울가요대상 본상 투표 24일 시작 [34th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1921d3a0042f451981c3bde33db697c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