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배우근기자] “선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타종목 감독이 최근 사이클대표팀 감독에게 어필한 내용이다. 발단은 이렇다. 9년차 사이클 대표팀 선수가 2020도쿄패럴림픽 중에 희망하는 지도자상을 표현했다. 그대로 옮기면 “선수 의견을 물으며 서로 배우는 사이, 훈련은 확실하게 하지만 평소엔 친구 같은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라고 했다.
이 발언이 지난 6일 칼럼 ‘스포츠과학화, 지도자부터 싹 바뀌어야한다’를 통해 보도된 후, 사이클 대표팀 감독에게 타종목 지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선수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 안되지 않나, 선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거냐, 타종목에 피해가 온다” 등등이다.
감독들의 넋두리였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면 틀에 갇혀 작은 것을 보지 못하는 처사다. 숲을 못보고 나무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행동이다. 부분에 집착하면 아집이고 독선이다. 되레 자신을 살피는 계기로 삼는게 현명한 처사다.
사이클 선수가 패럴림픽에서 한 말을 다시 살펴봤다. 딱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안보인다. ‘훈련은 확실하게 소통은 허물없이’로 이해된다. 선수관리를 잘 못했다는 갑작스런 지탄(?)에 사이클 감독도 어안이 벙벙하다.
심지어 그 감독은 평소 선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도자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연맹에 얘기해서 감독을 바꿔도 된다”라고. 그만큼 선수와 거리낌없이 소통했다. 훈련현장에서도 본분을 다했다.
타 종목 감독들이 아우성 친 이유는 다른데 있다. 칼럼의 결말에서 지도자들의 대오각성과 물갈이를 논하기 때문이다. 전체 지도자가 아닌 구시대적 권위와 전문성이 결여된 감독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여기에 속한 지도자는 움찔하고 몽니를 부릴 수 있다. 그러나 변혁을 위해선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
2020도쿄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장애인 스포츠 선진국과 한자리에서 비교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 과학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여기엔 지도자의 혁신도 포함된다. 기술이 좋아지고 데이터가 쌓여도 사람이 제 자리면 스포츠 과학화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현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각 단계별로 손 볼 곳이 많다. 스포츠 과학화를 기반으로 공정한 지도자 선발, 선수별 트레이닝 등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다면 나날이 발전하는 장애인스포츠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올림픽에서 영웅이 탄생한다면 패럴림픽에는 영웅이 출전한다. 이미 세상의 편견과 자신의 한계에 끊임없이 맞서 싸운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웅도 홀로 싸울 수 없다. 연대해야 더 강해진다. 그 역할을 지도자가 해야 한다. 우수한 능력을 갖춘 감독, 코치가 필요한 이유다.
“선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투덜된 지도자들은 “내가 지도자로 부족하다면 감독을 바꿔도 된다”고 말한 사이클 대표팀 감독의 진심을 새겨야 한다. 삿대질 하기 전에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지도자의 밥그릇은 탁월한 전문성으로만 지킬 수 있다.
kenny@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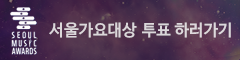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동성 키스신’으로 화제 모았던 혜리, 이번엔 파격 비키니 뒤태 공개[★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3/A1500415_5_20250313134655.png)



![K-POP 최고를 가린다…제34회 서울가요대상 본상 투표 24일 시작 [34th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1921d3a0042f451981c3bde33db697c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