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멋진 세리머니는 화려한 플레이의 ‘화룡점정’이다. 가을잔치가 무르익을수록 선수들의 몸짓도 점점 힘이 넘친다.
적시타를 치고 베이스를 밟은 타자는 두 팔을 번쩍 들며 환호한다. 삼진을 잡아 이닝을 매조진 투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기염을 토한다. 단, 상대의 열패감을 고려해 세리머니는 주로 더그아웃의 동료쪽으로 향한다.
|
야구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세리머니는 주로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의 몫이다. 자신의 한 방으로 피말리던 승리 마침표를 찍었으니 그 순간만큼은 이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짜릿하다. ‘야구의 꽃’은 홈런이지만, 선수들은 “끝내기 안타의 쾌감이 훨씬 크다”고 말한다.
그런데 야구는 타종목에 비해 세리머니가 짧고 점잖은 편이다. 축구선수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골을 넣은 뒤 코너로 달려가 멋지게 도약하는 건 기본이다. 흥겹게 춤을 추기도 하고 때론 동료와 미니 댄스도 펼친다. 때론 유니폼 상의를 벗어 근육질 몸매를 뽐내며 태어난 아기를 위해 양팔로 잠재우는 세리머니는 정겹다.
|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한 태극전사들의 메달 세리머니는 묵직하다. 수년간 흘린 굵은 땀방울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상대를 꺾고 정상에 오른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기쁨을 온몸으로 발산한다. 특히 오랜 기간 무관심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해 메달을 목에 건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세리머니는 깊은 울림을 전한다.
반면 ‘데일리 플레이어’ 야구선수는 역전타나 쐐기포와 같은 극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 기쁨을 잠시 보류한다. 홈런을 치고도 상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베이스를 돌았던 국민타자도 있었다. 하지만 정규시즌과 달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을 무대가 되면 소극적이던 야구선수들의 몸짓도 격해진다.
|
여기엔 기싸움의 이유가 있다. 올 가을 상대적으로 전력이 열세인 두산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경쟁하듯 힘찬 세리머니를 펼쳤다. 자가발전하며 에너지를 더 끌어올렸다. 동작을 크게 한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자신감의 표현이다. 반대로 자신감이 결여되면 자신도 모르게 고개 숙이기 마련이다.
플레이오프에서 두산과 삼성 선수들은 마치 곰과 사자처럼 그라운드에서 포효했다. 이길 수 있는 제스처다. 선수들의 세리머니 맞대결은 경기 외적인 재미이고 팬들의 감정이입을 이끌어내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
|
올해 야구 세리머니의 마무리는 한국시리즈(KS) 최종전에서 나올 것이다. 2010년대 왕조시설의 삼성은 손가락 개수로 통합우승의 횟수를 자랑했다. 왕조를 이어받은 두산의 세리머니엔 마블 히어로가 등장했다. 올해는 어떤 단체 세리머니가 나올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팬들을 향한 세리머니도 의미 있을듯 하다.
kenny@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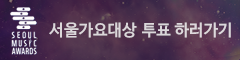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7회말 기회잇는 허경민[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1/11/11/news/2021111101000607400043583.jpg)
![[올림픽] \'할 수 있다\' 박상영 매직](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1/11/11/news/2021111101000607400043582.jpg)
![2회말 2타점 2루타 환호하는 페르난데스[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1/11/11/news/2021111101000607400043584.jpg)
![[SS포토] 두산 우승! 아이언맨 세리머니](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1/11/11/news/2021111101000607400043585.jpg)
![[SS포토] 삼성우승! 통합 4연패 달성!!!](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1/11/11/news/2021111101000607400043586.jpg)














![‘동성 키스신’으로 화제 모았던 혜리, 이번엔 파격 비키니 뒤태 공개[★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3/A1500415_5_20250313134655.png)



![K-POP 최고를 가린다…제34회 서울가요대상 본상 투표 24일 시작 [34th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1921d3a0042f451981c3bde33db697c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