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LA=문상열전문기자] 월드시리즈가 끝나고 프리에이전트 시장이 열리면 선수들의 몸값은 관심의 대상이다. 예상이 맞기도 하지만 빗나가는 경우가 흔하다. 해외파의 장기계약을 맺은 박찬호, 추신수(이상 텍사스 레인저스),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 등은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몸값을 받았다. 물론 여기에는 수완 좋은 슈퍼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의 역할도 한몫했다.
투수의 장기계약은 구단의 도박이다. 성공보다 실패한 케이스가 더 많다. 이미 2019년 12월 보라스가 맺은 투수 장기계약자 가운데 뉴욕 양키스 게릿 콜을 제외하면 댈러스 카이클(시카고 화이트삭스),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워싱턴 내셔널스), 류현진은 실패한 FA 계약이다. 추신수는 몸값에 비해 기량 발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케이스이지 이른바 ‘FA 먹튀’는 아니다.
박찬호와 류현진이 2001년, 2019년 겨울 FA 시장에서 몸값을 테스트할 때 미국 언론의 반응은 장기계약에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일종의 경고였다. 박찬호는 투수 찬화구장 다저스타디움과 원정에서의 성적이 워낙 차이가 커 ‘거품을 조심하라’는 지적이었다. 류현진은 데뷔 후 잦은 부상으로 ‘장기계약은 섶을 안고 불속을 뛰어 드는 격’이다고 워닝 사인을 줬다. 이 지적은 모두 맞았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2000년, 2001년 성적은 홈과 원정이 극명하게 달랐다. 2000년 홈 10승4패 2.34, 원정 8승6패 4.29, 2001년 홈 10승4패 2.36, 원정 5승7패 4.83이었다. 특히 5년 6500만 달러를 받고 둥지를 옮긴 텍사스 레인저스의 옛 알링턴 구장은 홈에서 외야쪽으로 강하게 바람이 부는 곳으로 투수에게 매우 불리했다. 아메리칸리그판 투수들의 무덤으로 통했다. 언론의 지적대로 이후 텍사스에서의 투구내용은 형편없었다. 당시 국내의 한 언론에서는 박찬호의 5년 계약이 끝날 때(34세) 또 다시 FA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꿈에 부푼 소설도 기사로 나온 적이 있다.
|
류현진은 2013년 데뷔 때가 26세다. 한창 전성기였다. 다저스에 7년 몸담으면서 규정이닝을 채운 해는 데뷔와 FA를 앞둔 2019년 두 차례다. 2015년 스프링 트레이닝 때 어깨 수술과 2016시즌을 포함해 두 시즌은 제로나 다름없다. 토론토 CEO 마크 사파이로는 계약 때 부상의 위험을 알고 있었고, 기자들로부터도 지적을 받았다. 4년 8000만 달러 도박은 도박으로 끝났다. 다행히 류현진에게는 행운이었던 2020시즌 PO 진출로 면피는 한 셈이다. 4년 계약에 한 차례라도 팀을 PO 진출시켰으니 먹튀 소리는 면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류현진의 2021시즌 전반기까지 LA 에인절스가 류현진을 붙잡지 않은 것을 두고 수 차례 기사와 유튜브로 조롱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펜더믹으로 일정이 60경기로 짧아지고 토론토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자 조롱은 절정을 이뤘다.
에인절스는 2019년 12월 에이스 게릿 콜을 붙잡으려다가 뉴욕 양키스의 돈 폭탄에 졌다. 콜은 에인절스타디움애서 지척인 뉴포트비치 출신이다. 에인절스는 고향팀이다. 투수력 부재이면서도 콜을 놓친 뒤에도 류현진 영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잦은 부상 때문이었다. 당시 구단의 제네럴매니저는 올해 초 뉴욕 메츠로 이적한 빌리 애플러였다. 에인절스는 콜을 잡으려다가 남은 돈 2억4500만 달러로 3루수 앤서니 렌돈과 7년 계약해 결국 실패한 FA 계약이 됐다.
사실 구단은 연봉을 시장가보다 많이 주더라도 단기계약을 맺고 싶어한다. 장기계약의 부담이 워낙 커서다. 하지만 슈퍼에이전트들이 움직이는 FA 시장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불길한 조짐과 언론의 지적은 늘 맞는다. 머피의 FA 계약 법칙인가?
|
moonsy1028@sportsseoul.com
기사추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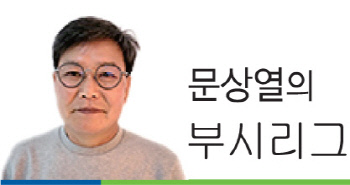




























![‘네일 재계약’ 최대 고비 넘었다→나머지 두 자리는?…KIA 여전히 바쁘다 [SS시선집중]](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4/11/28/news-p.v1.20241029.9d62e058102d436cab1312b286d59e99_R.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