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장강훈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향한 감독들의 성토가 전반기 마감을 앞둔 시기까지 이어진다. KBO는 성급한 행정으로 빌미를 제공했고, 심판진은 기본을 망각한 판정으로 연일 논란의 대상이 된다. 오심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하루에 네 차례나 쏟아졌는데, 특정팀에 쏠린 탓에 ‘사령탑 길들이기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뭔가 이상하다.
감독들의 성토는 과하다 싶은 내용도 있다. 정규시즌 일정을 1월에 발표했고, 올스타 브레이크가 짧다는 사실을 공지했는데도 “우리는 메이저리그가 아니다. 이런 식이면 스타급 선수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여과없이 흘러나왔다. 현장과 소통하라는 주장을 강하게 얘기한 셈인데, 20년 이상 바뀌지 않는 풍토가 감독 개인의 목소리로 바뀔리 만무하다.

KBO는 제도나 일정 관련 현장 불만이 쏟아지면 “실행위원회(단장회의)와 이사회(사장회의)에서 수차례 논의했고,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안이다. 구단 내부 소통 부재를 왜 KBO 탓으로 돌리는가”라는 답만 반복한다. 문자 그대로는 문제가 없다. 실행위와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도 맞고, 만장일치가 아니면 통과되지 않는 게 암묵적인 원칙이다. 사장이야 전문성이 떨어지니 물정을 모를 수 있다고 해도, 선수출신이 득세한 단장들은 현장과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외국인 선수나 엔트리 문제 등에 관해서는 활발히 소통하지만, 여전히 제도개선 등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분위기다. 감독은 매일 경기를 준비하고, 팀 분위기, 성적 등에 따라 기분 등락을 반복하므로 ‘먼 얘기’처럼 들리는 제도 개선 등에 관해 깊고 진지한 대화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KBO나 현장, 구단 모두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감독들의 성토가 빗발치는 건 “경기력과 관련된 제도개선은 KBO가 직접 현장과 소통하고,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해달라”는 일종의 읍소다.

정당한 요구라면, 감독들이 목소리를 합칠 필요도 있다. 개막 전 미디어데이나 올스타전 때 10개구단 감독이 한자리에 모인다. 올해는 외국인 감독도 없으므로 10명의 감독이 의견을 모아 같은 목소리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각개전투’보다 파급력이 크다. 모든 감독 의견이 같을 수는 없지만, 건강한 KBO리그를 위해서는 감독 간의 설득과정도 필요하다.

KBO가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빈축을 사는 모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흥행도 좋고 이슈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KBO는 선수들이 최상의 플레이를 펼칠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도 게을리해선 안된다. 때문에 총재가 직접 감독과 대화자리를 마련하고, 이왕이면 프로야구선수협회장을 비롯한 선수 대표들과도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게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런 과정이 없으니 특정팀을 향한 ‘KBO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롯데 김태형 감독은 시즌 전 자동볼스트라이크 판정시스템(ABS)과 피치클락 도입을 두고 KBO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팀 성적이 바닥권이어서 엉뚱한 곳에 화풀이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원색적인 비난까지 한 탓에 팀 분위기가 상승기류를 탈 때마다 어이없는 오심으로 찬물을 끼얹는 게 우연인지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팬도 있다.

언뜻 현장과 KBO의 기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이 전반기 내 이어졌다. 폭발적인 흥행에 힘입어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을 불식할 만한 제스처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상생은 지자체장과만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zzang@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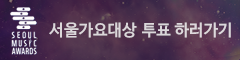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김수현, 그래서 ‘김새론 미성년자’ 때 무슨 사이였죠? [SS초점]](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4/01/news-p.v1.20250331.4db130d06fc94e95a77f212e785fab0e_P1.jpg)












![‘동성 키스신’으로 화제 모았던 혜리, 이번엔 파격 비키니 뒤태 공개[★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3/A1500415_5_20250313134655.png)



![K-POP 최고를 가린다…제34회 서울가요대상 본상 투표 24일 시작 [34th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1921d3a0042f451981c3bde33db697c4_P1.jpg)






![루버는 왜 떨어졌는가? NC·창원시·KBO 모두 자유롭지 않다[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31/news-p.v1.20250330.119a566d84a94426a49649ce4fd60b52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