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골염증 양의지 WC 앞두고 “준PO 준비중”
내일이 없는 단기전서 ‘넥스트’ 생각이 패착
베테랑 의존도 강한데 코치진 노하우는 부족
‘육상부’ 아닌 ‘화수분’ 되찾아야 강팀 도약

[스포츠서울 | 장강훈 기자] 귀를 의심했다. 어쩌면 잠실 ‘한지붕 두 가족’이 펼치는 가을잔치는 볼 수 없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사실상 단판 승부인 가을잔치 첫 스테이지에서 ‘뒤를 생각한다고?’ 뒤를 먼저 생각하는 단기전은 내일이 없다. 아니, 안 온다.

“준플레이오프(준PO)에 대비하고 있다.”
정규시즌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일찌감치 와일드카드결정전(WC) 진출을 확정한 두산 쪽에서 나온 얘기는 귀를 의심케 했다. ‘전력의 절반’으로 불리는 양의지가 쇄골 염증으로 개점휴업 중이었는데, 주사와 약물 치료와 휴식을 병행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따라붙었다.
두산의 시즌은 ‘양의지가 준PO에 맞춰 컨디션을 조율 중’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막을 내렸다.

차라리 “양의지 없이 가을잔치에 들어간다. 우리 선수들이 양의지 없이도 충분히 강팀이라는 것을 단기전에서도 증명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대비할 수 있는데, ‘절반의 전력으로 어떻게 싸울까’라는 생각이 앞서면 전략이고 전술이고 무소용이다. 함께 뛰어야 하는 선수들의 머릿속에 ‘우리는 들러리에 불과한가’라는 의문이 0.01% 확률이어도 남기 때문이다.

2일 치른 WC 1차전부터 그랬다. 1회 내준 점수를 끝까지 만회하지 못했다. 개천절에 치른 3일은 더 처참했다. 코치진과 선수단 모두 중압감과 위축감에 정상 전력을 가동하지 못했다.
설상가상 재활 중인 양의지는 경기 전 취재진과 만나 “수비는 가능하지만, 타격은 안된다”는 말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쓰지 못할 자원을 엔트리에 올려둔 것도 아이러니인데, 다음 스테이지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날 “준PO에 맞춰 컨디셔닝 중”이라고 친절(?)하게 상태를 알리는 우를 범했다.
원정팀인 KT로서는 ‘양의지가 오늘도 못나온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진채 경기를 치르게 됐다. ‘육상부’는 즐비하지만, ‘대포’가 부족한데다 클러치히터가 없는 두산 타선을 고려하면 ‘주자만 모아두지 말자’는 단순한 전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셈이다.

최승용이라는 의외의 선발카드는 예상외 호투로 초반 흐름을 대등하게 만들었다. 5회초 2사 1,2루에서 역투 중이던 최승용을 내린 건 두산 벤치의 조급증을 드러내는 대목. 이영하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이병헌이 위기를 넘겨 결과적으로는 문제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불펜 운영 등을 고려하면 한박자 이상 빠른 교체였다.
최승용의 구위가 떨어졌더라도 호흡할 시간을 주는 등 흐름을 바꿀 여유가 필요해보였다.
‘마운드에 선 투수의 기세가 좋을 때는 가급적 그냥 둬야 한다’는 두산 왕조의 단기전 승리공식을 스스로 깬 셈이다.

‘위기 뒤 기회’였던 5회말 1사 2루에서 스킵동작 중 귀루 스타트를 했던 양석환을 홈으로 보낸 무리한 주루 시그널도 두산의 조급증을 드러낸 장면이다. 양석환의 스텝을 봤더라면, 홈 쇄도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 설상가상 KT 좌익수 멜 로하스 주니어가 포구해 원 스텝할 때까지 양석환은 3루를 밟지 못했다.

2연속시즌 WC 결정전에 진출한 두산은 제도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업셋을 허용한 팀으로 전락했다. “양의지가 없어도 우리는 강하다”는 강한 자기최면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의 호흡을 가쁘게 만드는 조임도 보이지 않았다.
무색무취로는 강팀으로 도약하기 어렵다. 올해 두산은 단 한 경기도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지 못했다. ‘내일이 있으니까’라는 안일함이 그나마 희미하게 드러난 색채였다.

육상부가 아닌 ‘화수분’을 재건을 선행하는 게 ‘왕조재건’의 초석이라는 점을 2년간 가을잔치 실패로 배웠으면 한다. 두산이 언제부터 내일을 얘기했나. zzang@sportsseoul.com

기사추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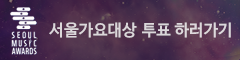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김수현, 그래서 ‘김새론 미성년자’ 때 무슨 사이였죠? [SS초점]](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4/01/news-p.v1.20250331.4db130d06fc94e95a77f212e785fab0e_P1.jpg)












![‘동성 키스신’으로 화제 모았던 혜리, 이번엔 파격 비키니 뒤태 공개[★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3/A1500415_5_20250313134655.png)



![K-POP 최고를 가린다…제34회 서울가요대상 본상 투표 24일 시작 [34th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1921d3a0042f451981c3bde33db697c4_P1.jpg)






![루버는 왜 떨어졌는가? NC·창원시·KBO 모두 자유롭지 않다[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31/news-p.v1.20250330.119a566d84a94426a49649ce4fd60b52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