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책임론 대두’ 헌재 선고 지연 장기화되면? 문형배, 선고일 직권 지정 가능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직권 선고일 지정’ 가능성이 주목받는다.
헌법재판소 내 일부 재판관의 이견으로 선고 일정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재판장인 문형배 대행이 직권으로 선고 기일을 정할 수 있다는 것.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부장판사 출신)은 3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소송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장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준용되는 헌법재판소법의 원칙상, 재판장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단독 판단으로도 선고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선고는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가 아닌 정족수(6명 이상)의 찬성만으로 결정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재판관이 선고일 지정에 반대하거나, 의견 조율을 이유로 지연할 경우에도 재판장이 직권으로 선고일을 공표하고 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한 전 감찰부장은 “일부 재판관이 끝내 서명을 거부할 경우에도 선고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명날인 불능선고’ 또는 ‘서명날인 거부선고’는 기존 판례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결정문에 해당 재판관의 서명이 없는 형태로도 선고는 유효하다.
이런 방식은 과거에도 출장이나 개인적 사유로 재판관이 선고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사용된 바 있다. 결국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절차적 완결성’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배경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국민적 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문형배 권한대행이 재판장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enny@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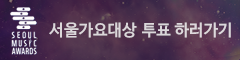














![‘동성 키스신’으로 화제 모았던 혜리, 이번엔 파격 비키니 뒤태 공개[★SNS]](https://file.sportsseoul.com/svc/desking/1000/index/202503/A1500415_5_20250313134655.png)



![K-POP 최고를 가린다…제34회 서울가요대상 본상 투표 24일 시작 [34th 서울가요대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1921d3a0042f451981c3bde33db697c4_P1.jpg)











